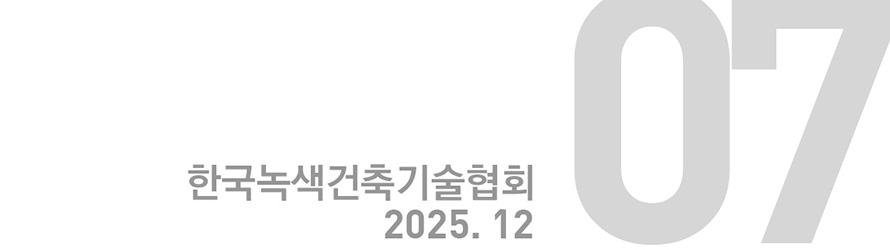1.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별 선언과 별개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후 목표 상향 동맹(Climate Ambition Alliance)’에 가입한 국가는 2021년 기준 136개국에 달한다1).
한국 역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포함한 구체적인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특히 건물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32.8% 감축(약 3,500만 톤 CO2eq)을 목표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건축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
본 고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대건설과 현대제철이 함께 진행한 탄소 저감형 건설자재 적용 효과 분석을 다루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두 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탄소저감 자재를 적용하기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 부산물을 활용한 저탄소 콘크리트, 저탄소 철근 및 강재를 적용했을 때 건축자재별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평가하였다.
평가 범위는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전과정 탄소배출)이며, 이를 내재 탄소(Embodied Carbon)와 운영 탄소(Operational Carbon)로 구분하였다. 내재 탄소는 건축 자재의 생산, 운송, 시공, 해체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이며, 운영 탄소는 건축물이 사용되는 동안(냉난방, 조명 등) 발생하는 탄소이다. 일반적인 에너지효율 1+등급 업무용 건축물의 사례를 보면, 전과정 탄소배출 중 운영 단계가 74.5%, 내재 탄소가 2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 탄소배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재 생산단계 23.8%, 자재 운송단계 0.7%, 시공단계 0.3%, 유지관리단계 0.5%, 해체단계 0.1%, 폐기단계 0.1%로 구성된다. 특히 내재 탄소 중에서도 자재 생산단계가 전체의 약 93%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재 생산단계를 주요 분석 범위로 설정하고, 운영 단계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전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전과정평가 방법론
본 고에서는 녹색건축인증(G-SEED) 제도에서 사용하는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방법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내재탄소배출량을 계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주요 건축자재별 탄소배출계수를 조사하였다.
녹색건축인증(G-SEED)은 건축물의 자재 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전 생애주기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에너지 절약, 자원 효율성, 오염물질 저감, 실내 환경의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3). 이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항목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기준 모두에서 ‘혁신적인 설계(Innovative Design, ID): 재료 및 자원’ 분야에 포함된다. 이 항목은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기준에서는 건축자재의 생산·시공·사용·해체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한 전과정평가 수행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건축물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건축물의 기본정보(위치, 배치, 평면, 규모,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평가대상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주거, 업무, 교육, 판매, 숙박 등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기능단위는 동일한 수준의 건축물 기능을 수치로 표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축물의 단위면적(㎡)을 기능단위로 적용한다.
평가기간은 50년으로 설정하며, 매년 동일한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운영에너지 사용 부문 평가는 건축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1차 에너지소요량 및 면적 정보를 활용한다.
데이터 범주는 투입물과 산출물로 구분된다. 투입물은 원료·보조물질 및 에너지, 산출물은 제품, 부산물, 배출물, 폐기물로 분류된다. 전과정평가를 위해서는 시스템 경계 내의 각 단위공정별 정량적 목록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내부데이터와 외부데이터로 구분하며, 각각 지역적·시간적·기술적 범위에 따라 세분화하여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과정평가 보고서에는 데이터 계산 방법, 데이터 공백(갭), 시공·운영·폐기 단계 시나리오, 평가 시 가정 및 제한사항 등을 명확히 기술한다. 또한 평가 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기준을 신중하게 설정하였으며, 건축물에 투입되는 자재 중 누적 질량기여도 상위 99%를 평가에 포함한다.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현장 측정·계산 데이터를 우선 적용하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참고문헌 기반의 일반데이터를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과정평가에 적용 가능한 탄소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DB)로는 국가 LCI DB(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환경성적표지 평가계수, 환경성적표지 탄소발자국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 세 가지 DB를 기반으로 건축물 내재탄소 평가에 필요한 주요 건축자재의 생산단계 탄소배출계수를 조사하였다.
생산단계 평가는 건축물의 설계내역 및 준공내역을 토대로 평가대상 분류, 단위환산, 그룹화, 제외기준 검토, 세분화 등 세부 절차를 거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4종의 대표 건축자재군(콘크리트, 철근, 형강, 유리, 벽돌, 단열재, 석고보드, 시멘트, 석재, 골재, 목재, 도료, 철재, 타일)을 선정하고, 각 자재군에 대해 현대건설 구축 LCA DB, 국가 LCI DB, 환경성적표지 평가계수, 최대허용 탄소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탄소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4). 이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철근, 형강 제품을 대상으로 탄소 저감형 건설자재 적용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였다.

3. 평가대상
3.1 평가대상 및 목적
본 평가대상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데이터센터 신축공사이며, 전과정평가(LCA) 기법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단계별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본 평가의 목적으로 하였다.
3.2 평가범위 및 기준
본 평가의 범위는 건축물의 생산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 폐기단계로 구성된다. 평가기간은 5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건축물의 수명을 50년으로 가정한 것을 의미한다. 본 평가에서는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를 주요 환경영향 항목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평가의 기준기능은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이며, 기능단위는 50년간 사용되는 건축물의 단위면적(m2)이다. 기준 흐름은 50년 동안 건축물의 사용에 투입되는 물질과 에너지로 정의하였다.

3.3 평가대상
본 평가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데이터센터 신축공사』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3.4 시스템 경계
본 평가의 시스템 경계는 Cradle to Grave로, 이는 평가대상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축자재의 생산단계부터 건축물의 운영·유지관리, 해체 및 건설폐기물의 소각·매립 단계까지의 전과정을 포함한다. 본 평가에서는 이 중 생산단계와 운영단계를 대상으로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였다.

생산단계는 자재의 원료 채취, 가공, 제조 등 생산 전반의 과정을 포함하며, 이 과정에서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고려한다. 운영단계는 건축물이 완공된 후 해체되기 전까지의 사용기간을 의미하며, 건물 이용자의 활동, 설비 및 기계의 가동, 유지·보수 등 건물의 노후화를 관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특히 운영에너지사용과정에서는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사용되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환경영향을 반영한다. 본 평가에서는 건축물의 전과정 단계를 생산과정, 운송과정, 시공과정, 운영에너지 사용, 교체, 해체, 운송, 폐기(소각·매립) 과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3.5 데이터 수집
본 평가의 데이터 범주는 투입물과 산출물로 구분되며, 투입물에는 원료, 보조물질, 에너지 등이 포함되며 산출물에는 제품, 부산물, 대기 배출물,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스템 경계 내 각 단위공정별 목록 데이터(Life Cycle Inventory)를 수집·분석하였다.

내부데이터와 외부데이터의 품질요건은 시간적, 지역적, 기술적 범위로 구분하였다. 내부데이터의 지역적 범위는 평가대상 현장 데이터, 시간적 범위는 평가 수행 시점, 기술적 범위는 설계내역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수집된 건축자재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외부데이터는 국내에서 구축된 최신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적용하며, 동종 또는 유사 건축자재와 에너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6 가정 및 제한사항
본 전과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생산단계의 건축자재 소요량 집계 시, 타 건축물에서 이미 사용되었었거나 향후에 타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재사용될 수 있는 가설자재와 가설공종에 해당되는 기타 자재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전과정 탄소배출량 평가
4.1 공동주택 및 데이터센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평가
본 장에서는 주요 건축자재를 선정하기 위해 설계내역을 수집하였으며 전체 시공내역 중, 건축공사 시공내역을 대상으로 가설공사, 토공사, 가구공사, 투입자재내역, 시공장비 및 방법, 공사비, 기타자재 항목을 제외하고 건축자재만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과정평가는 평가대상 건축물의 설계내역서를 기반으로 자재별 투입량 및 투입비율을 분석하여 수행하였으며, 운영단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에너지과정 탄소배출량을 공동주택 1,060 kgCO2eq/m2, 업무용 건축물 2,040 kgCO2eq/m2로 설정하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생산단계와 운영단계의 단위 면적당 탄소배출량은 각각 440 kgCO2eq/m2, 1,060 kgCO2eq/m2으로 산출되었으며 탄소배출 기여도는 생산단계 29%, 운영단계 71%로 나타났다.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생산단계와 운영단계의 단위 면적당 탄소배출량은 각각 539 kgCO2eq/m2, 2,040 kgCO2eq/m2으로 산출되었으며 탄소배출 기여도는 생산단계 21%, 운영단계 79%로 분석되었다.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로, 생산단계 탄소배출량 대부분은 콘크리트 및 철근 물량에 기인하며, 동일 구조의 다른 건축물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주요 건축자재군별 탄소배출 기여도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약 74.9%, 전체 구조자재(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철근, 형강, 금속재) 약 82.5%, 시멘트 콘크리트 및 벽돌제품 약 9%를 차지하였다. 업무용 건축물은 철골조로, 생산단계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이 콘크리트와 형강 물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탄소배출량 중 운영단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건축물 수명 동안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 사용량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4.2 건축자재 투입 조건별 내재 탄소저감량 분석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탄소배출계수를 기존 OPC 배합 DB와 3성분계 배합인 자체구축 DB를 적용하여 건축물 생산단계의 내재 탄소배출 저감량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은 148.1 kgCO2eq/m2, 업무용 건축물은 109.5 kgCO2eq/m2의 저감효과를 보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서 약 44.94%의 저감율이 나타났다.
철근의 경우, 현대제철 철근 EPD 값으로 적용한 결과 생산단계 내재 탄소배출 저감량은 공동주택은 3.2 kgCO2eq/m2, 업무용 건축물은 3.3 kgCO2eq/m2으로 분석되어 약 9.85%의 저감율을 보였다.
형강의 탄소배출계수를 현대제철 H형강 EPD 값으로 적용한 결과 업무용 건축물의 생산단계 내재탄소 배출량은 69.5 kgCO2eq/m2 저감되어 약 36.47%의 저감율을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탄소 저감형 건설자재를 적용한 경우 생산단계 내재탄소 저감율은 공동주택에서 약 34.42%, 업무용 건축물에서 약 33.41%로 평가되었다.

내재탄소배출량과 운영탄소배출량을 합산하여 총 탄소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공동주택은 약 38,949 톤 CO2eq, 업무용 건축물은 약 18,051 톤 CO2eq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단위 면적당 저감량은 각각 공동주택 0.18톤 CO2eq/m2, 업무용 건축물 약 0.15 톤 CO2eq/m2로 분석되었다. 내재 및 운영단계를 통합한 전체 탄소배출 저감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약 10.09%, 업무용 건축물은 약 7.07%로 평가되어, 저탄소 건축자재 적용이 전과정 수준에서 의미 있는 감축 효과를 제공함이 확인되었다.
5. 맺음말
본 고에서는 현대건설과 현대제철의 탄소 저감형 건축자재 적용 조건에 따른 건축물 내재탄소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 두 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기존 대비 개선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내재탄소 배출량 및 저감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였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데이터센터 신축공사를 대상으로, 탄소 저감형 건축자재 적용에 따른 건축물 내재탄소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전과정평가 결과, 각 건축물의 총 탄소배출량은 각각 385,819,284 kg-CO2eq 및 255,503,480 kg-CO2eq로 산출되었으며, 단위면적당 배출량은 각각 1,500 kg-CO2eq/m2와 2,579 kg-CO2eq/m2로 평가되었다.
3) 탄소 저감형 건축자재를 적용한 결과, 생산단계 내재탄소 배출량은 공동주택 약 34.42%, 업무용 건축물 약 33.41%가 저감되었으며, 전체 전과정 기준 총 탄소저감율은 공동주택 10.09%, 업무용 건축물 7.07%로 분석되었다.
4) 건축물의 전과정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철근, 형강 등 주요 구조재 부문의 저탄소 자재 적용이 핵심적 요소로 판단된다.
출처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4) 누구나 알기쉬운 탄소중립 녹색성장 안내서, 녹색성장위원회
2. 관계부처합동 (2021)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4)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 2016-7 v3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 환경성적표지제도 인증제품 현황